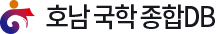1923년 6월 18일에 양회갑이 차운시를 동봉하여 보낸 편지로 여름에 편지를 보냈더니 갑자기 맑은 바람이 더운 얼굴에 불어 세계가 이러하니 회포에 세강정을 지어 어찌 이와 같은 바람이 부는가? 공부하시는 생활은 좋으시고 벗도 오고 인편도 와 즐거운 것을 알게 되니 축하하고 부럽습니다. 나는 부모님 모시고 분수에 의지해 살고 있습니다. 벗들이 떠나 쓸쓸함은 날로 심해지고 옛날 들었던 것은 모두 잃어 스스로 안타까우니 어찌하겠습니까? 앞선 정자의 시를 이어 서술하니 우러러 효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알아 운을 보내 부탁하니 평소에는 반나절이면 지었으나 거칠어지고 더럽혀져 거듭 어기지 않는 것이 없어 겨우 이렇게 앝고 누추하게 가슴속의 졸렬함을 얽었으니 어찌 새롭고 신선한 말이 있어 들려드리겠습니까? 보고나서 버리시기를 바라고 바랍니다. 조백거는 김재종과 거리가 멀든 가깝든 어찌 사는지 자취를 따라보셨는지요? 회포는 산과 같이 쌓여 매번 마음이 가느라 수고로우나 나아가 만날 길이 없으니 말을 하는데 서글픔이 생깁니다. 나머지는 줄이고 답장 편지 올립니다.
계해년 6월 18일 양회갑 두 번 절함.
추신 을에서 갑을 구하니 한 발짝 나아가는 재미가 있는가요? 우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