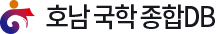이 글은 1920년 4월 10일에 김기중이 기석사에게 보낸 위장으로, 존조비(尊祖妣) 유인(孺人)의 부고를 접하고 보낸 것이다. 발신자는 서두에서 전혀 예기치 못한 비극적인 변고가 닥쳤음을 한탄한다. 이어 존조비가 손자들의 봉양을 받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사실을 애석하게 언급하고, 부고를 접한 뒤 놀람과 비통함이 그치지 않는 심정을 드러낸다.
그는 상주의 효심이 순수하고 지극한 면을 높이 평가하며, 지극한 효심이 깊은 애통으로 이어졌음을 안타까워한다. 세월이 빠르게 흘러 벌써 졸곡(卒哭)의 시점에 이르렀음을 전하며, 이 슬픔이 끝이 없다고 강조한다. 발신자는 상주가 혹시 상례로 인한 병고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은지 살피고, 기력의 상태를 묻는다. 그리고 부디 죽이나 소식을 먹으며 예법에 따라 상례를 이어가기를 당부한다.
편지의 말미에서 발신자는 자신이 공무에 얽매임으로 인해 직접 달려가 위문하지 못함을 사과하고, 그로 인해 위문이 지연된 것을 안타까워한다. 부족하더라도 이 서간으로 애도의 뜻을 전하니 살펴 주기를 바라는 말로 맺는다.
이 문서는 조선 후기 상장례에서 친족 간의 위문 서신 형식을 잘 보여주는 자료다. '졸곡' 시점의 언급을 통해 상례 진행 단계와 시기를 확인할 수 있으며, '차독(茶毒)'과 같은 병환 우려, '기력'과 '소식' 권유를 통해 상주가 상례 중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배려하는 당시의 인식이 드러난다. 또한 '존조비'라는 호칭에서 가계 내 위계와 친족 관계를 파악할 수 있으며, 발신자가 공무로 인해 조문하지 못한 상황은 관직과 사적 예절이 충돌하는 양상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