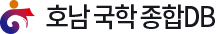이 문서는 1918년 12월 16일에 정운대가 기석사에게 보낸 위장이다. 발신자인 정운대는 편지 첫머리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부친상 소식을 접했을 때의 충격을 표현한다. 수신자가 부모 봉양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채 부친을 잃은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이를 자신의 일처럼 애통해한다. 이어 놀람과 슬픔이 그치지 않는다고 전하며, 상주의 효심이 순수하고 지극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부친을 그리워하며 목 놓아 우는 마음이 얼마나 클지,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임을 거듭 드러낸다.
또한 상주가 차독(茶毒)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며, 부디 죽식[粥食]을 드시고 예법에 따라 장례를 완수하기를 권면한다. 정운대는 자신이 여러 업무에 얽매여 직접 찾아가 위문하지 못한 사정을 밝히고, 대신 마음을 담아 문안을 올리니 부디 살펴 달라고 전한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정성을 헤아려 달라는 당부와 함께 위문의 뜻을 마무리한다.
이 위장은 조선 후기 상례 위문의 정형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예제를 따르다[俯從禮制]"와 같이 장례 절차 준수를 권하는 표현과, 상주의 건강 회복을 기원하는 부분이 결합되어, 유교적 예의와 인간적 정서가 함께 드러난다. 또한 발신자가 직접 조문하지 못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점은 당시 서신 관행 속에서 예절과 현실적 사정이 어떻게 조율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