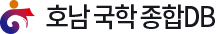문서는 1918년에 김용선, 김용택이 기석사에게 보낸 위장이다. 발신자인 김용선·김용택은 기석사의 부친 별세 소식을 뜻밖에 접하고 깊이 놀라 슬퍼하며, 유족의 심정을 헤아려 애도의 뜻을 표한다. 이들은 고인의 자제가 지극한 효성을 지녀 슬픔과 그리움이 극에 달했음을 언급하며, 달이 바뀔 만큼 시간이 흘렀어도 애통이 가시지 않을 것임을 위로한다.
이어서 상주가 스스로 병고를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며, 기력을 돋우기 위해 미음을 드시고 예법에 따라 장례를 마치기를 당부한다. 또한 자신들 역시 병환 등으로 인해 직접 찾아가 위문하지 못한 점을 깊이 미안하게 여기며, 멀리서나마 마음을 전하니 살펴 주시길 바란다는 뜻으로 마무리한다.
이 문서는 조선 말기 친족 및 지인 간의 상례 위문 형식을 잘 보여주며, 애도의 언사와 함께 상주의 건강을 염려하는 전통적 예문 구조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 특히 "예제를 따르다[俯從禮制]"와 같은 표현은 장례 절차의 완결을 예로 삼아 권면하는 당대 상장례 문화의 일면을 보여주며, 병중으로 인해 직접 조문하지 못하는 사정을 솔직히 밝히는 점도 주목된다.